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서포 김만중(西浦 金萬重, 1637~1692)은 효(孝)를 실천하며 문학으로 마음을 다스린 인물이다. 그는 「구운몽(九雲夢)」,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등 우리 고전문학(古典文學)의 백미(白眉)를 남기며 당대 문단을 이끌었다. 조정의 풍파 속에서도 세 차례의 유배(① 1674년 강원도 고성, ② 1687년 평안도 선천, ③ 1689년 경남 남해 노도)를 겪는 동안에도 붓을 놓지 않았다.
특히 세 번째 유배지인 남해 노도(櫓島)는 김만중 문학 인생의 후반을 상징적으로 장식한 장소로, 오늘날 '문학의 섬'이라는 현대적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그의 유배지에서의 삶과 효심, 그리고 문학적 유산은 남해 지역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과 깊이 맞닿아 있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의 문화·경제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만중은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에 연루되어 정치적 모함을 받아 52세에 남해 노도(櫓島)로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병마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립된 유배지에서 여러 문학 작품과 서한집을 남기며 내면의 성찰을 이어갔고, 조선 지식인의 품격을 지켜냈다.
특히 병중에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효심을 다한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어머니의 병환을 걱정하며 여러 차례 정성 어린 편지를 써, 마치 곁에 있는 듯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전했다. 당시의 효(孝)는 단순한 가족 간의 도리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본분이자, 유교적 삶의 핵심 가치였으며, 김만중은 이를 온전히 실천한 인물이었다. 노도(櫓島)는 그에게 유배지이자 또 하나의 문학 공간이었다. 남해의 조용한 풍경과 푸른 바다에서 그의 내면은 더욱 깊어졌고, 그 통찰은 문장으로 승화되었다. 오늘날 노도는 '문학의 섬'이라는 현대적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김만중 문학관, 서포 공원, 문학 산책로, 서포길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을 따라 걸으며 그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문학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학 공간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교육과 사색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도(櫓島)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접근성 문제, 콘텐츠 부족 등이 아쉽다. 특히 백련마을과 노도는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나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 노도 방문의 진입 장벽이 높다. 따라서 노도의 문학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지역 관광과 교육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백련마을과 노도를 잇는 소규모 연결 교량(橋梁) 건설이 꼭 필요하다. 이 다리는 단순한 기반 시설을 넘어, '문학의 섬' 노도의 정체성과 일상을 잇는 상징적 통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노도를 더욱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문학관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청소년 대상의 '문학 캠프', '고전 읽기 워크숍', '효 사상과 삶의 성찰'과 같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섬의 문학적 가치를 다음 세대와 연결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히 경남교육청과 남해군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둘째, 문화예술(文化藝術)과 관광(觀光)을 융합한 콘텐츠의 개발이다. 노도의 풍광과 김만중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AR(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 가이드 투어, 문학극장, 야외 낭독극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정기화할 수 있다.
셋째, 주민 참여형 지역 축제와 문학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남해군에서는 김만중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김만중문학상'을 제정·운영하며,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특히 소설가 한강(韓江)은 2022년 제13회 김만중문학상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남해군과도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수상자가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거나, 수상작을 연극이나 전시 등으로 재구성하는 행사가 함께 마련된다면, 김만중 문학과 지역 사회가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 관광'을 핵심으로 숙박, 식음, 체험이 융합된 콘텐츠 개발과 소규모 체류형 여행 모델 도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예컨대 김만중 편지를 모티브로 한 '서포 체험 키트', 고전문학 주제의 소형 북카페, 효 문화를 활용한 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이 창의적인 시도가 될 수 있다.
끝으로, 김만중의 효(孝) 사상은 오늘날 교육에서도 소중한 자산이다.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고 효 개념이 재정의되는 사회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가족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다. 유배지에서도 김만중이 어머니를 향한 마음은 전통적인 효 사상을 넘어, 인간관계의 진정성과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과 고전 독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문학 속 인물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서포 김만중과 그의 유배지 노도(櫓島)는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니다. 효심과 문학, 사색과 실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한 인간의 정신이 남긴 자취다. 우리는 이 가치를 바탕으로 노도를 지역의 문화·교육·경제적 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 유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해 문학이 살아 숨 쉬는 지역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도의 바람이 김만중의 붓끝을 흔들었듯, 그의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이제 그 뜻을 지역과 교육, 사람들 사이에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
[최성기 선생의 교육이야기] 유배지에서 피어난 문학의 혼, 김만중과 남해 노도
∥서포 김만중은 효를 실천하며 문학으로 내면을 다스리고, 유배지에서도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과 문학적 성취를 통해 조선 지식인의 품격과 인간적 가치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의 유배지인 남해 노도는 단순한 역사적 장소가 아닌,문학과 효 사상, 교육과 관광, 지역 문화·경제를 연결하는 현대적 자산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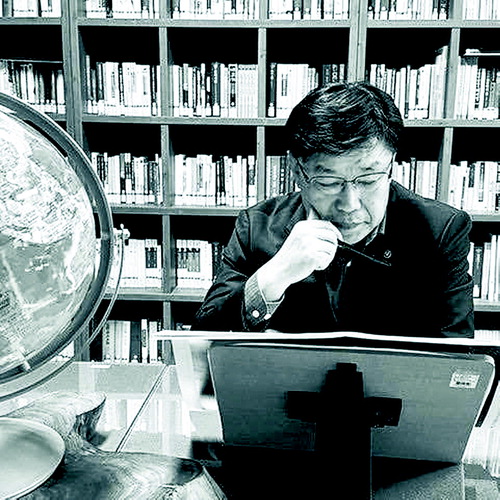
∥서포 김만중은 효를 실천하며 문학으로 내면을 다스리고, 유배지에서도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과 문학적 성취를 통해 조선 지식인의 품격과 인간적 가치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의 유배지인 남해 노도는 단순한 역사적 장소가 아닌,문학과 효 사상, 교육과 관광, 지역 문화·경제를 연결하는 현대적 자산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다.
2025. 09.19. 10:2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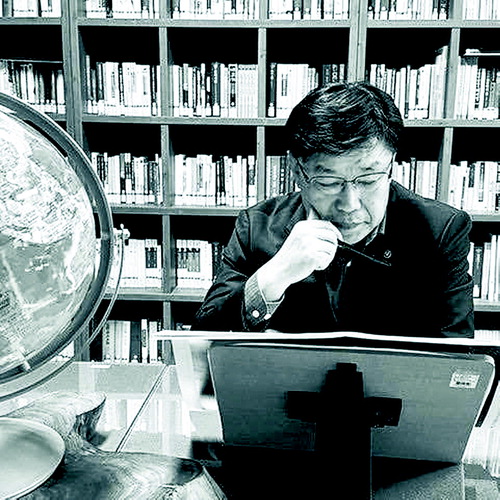
실시간 HOT 뉴스
- 1[최성기 선생의 교육이야기] 유배지에서 피어난 문학의 …
- 2[곽기영의 남해 詩산책] 어머니의 성정 [性情]
- 3서면노인대학,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 개최
- 4설천면 새마을, 배추 모종 심기 봉사활동
- 5어린이·임신부'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