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農漁村) 지역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과 대책을 경상남도 남해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 9월 1일 기준, 남해군의 전체 학생 수는 초등학교 994명, 중학교 786명, 고등학교 1,259명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보면 감소 폭이 매우 크다.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1971년 남해군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25,692명, 중학교는 1976년에 10,210명, 고등학교는 1982년에 6,202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십 년 사이 학생 수가 급감한 현상은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 교육 여건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존립(存立)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低出産)과 학령인구(學齡人口) 감소이다. 특히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은 일자리 부족과 생활 인프라의 한계, 교육과 의료(醫療)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유출(流出)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곧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고령화(高齡化)되고, 인구 유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학교의 통폐합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해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었다. 교사 수는 물론, 다양한 수업과 방과 후 활동, 예체능·특기 교육이 축소되며, 아이들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지역 공동체(共同體)의 구심점(求心點) 역할을 하던 시절과 달리, 교육 기능의 약화는 곧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활력 상실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폐교(閉校) 위기에 놓인 학교들은 지역 정체성의 상실과 문화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교 운영 유지 차원을 넘어서는 근본적(根本的)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 통합과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학생 수가 감소한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간 통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원격 수업, 스마트 교육,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생 수가 적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대학이나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로 탐색, 진학지도, 직업교육 등의 영역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竝行)되어야 하며, 다양한 연수와 협업(協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적(綜合的)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 주거, 육아, 의료 등 복합적(複合的)인 요소가 함께 개선되어야 인구 유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기업,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戰略的)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시범 마을'을 조성하여 주거, 일자리, 교육을 연계한 복합 모델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학교(學校)와 지역사회(地域社會)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단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 경제, 사회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교육과정, 마을 단위의 체험학습,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상호작용(相互作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농업·어업 자원을 활용한 진로 교육, 마을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등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다시 활력을 얻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의 적극적(積極的)인 재정(財政)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교육의 특수성(特殊性)과 지속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의 지속 운영을 가능케 하고, 영구적인 농어촌 교육 특구 지정 등의 제도적 장치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교육 공동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 수 감소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적(社會的) 문제이다. 남해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인구 유입(流入)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결합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결국, 농어촌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교육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에 달려 있다. 지역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은 바로 오늘의 교육 혁신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통해 남해군은 학생 수 감소의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어촌 교육이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최성기 선생의 교육이야기] 농어촌 학교 위기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 남해군을 중심으로
·남해군의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시절에는 학생 수만 4만 명을 넘어, 이는 오늘날 남해군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았다. ·
농어촌 지역, 특히 남해군의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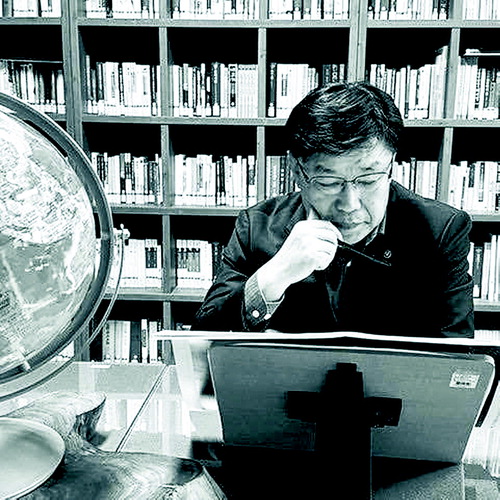
·남해군의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시절에는 학생 수만 4만 명을 넘어, 이는 오늘날 남해군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았다. ·
농어촌 지역, 특히 남해군의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2025. 10.02. 10:4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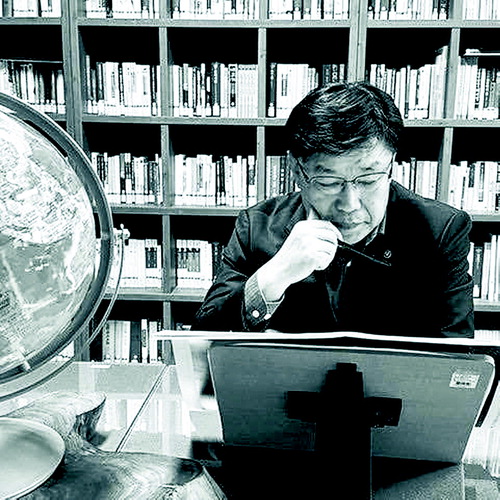
실시간 HOT 뉴스
- 1혼란한 시대, 송시열의 교육 철학이 묻는 '사람을 위한…
- 2[곽기영의 남해 詩산책] 일자상서(日字上書)
- 3이동면적십자봉사회'사랑의 자장면 나눔'
- 4한국여성어업인남해군수협분회, 150그릇 전복죽 전…
- 5창선 수산경로당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 개최








